학부 시절 현대 불문학 강의를 들으면서 인상적이었던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당시 50대 중반이던 연세에도 불구하고 미모를 유지하고 계셨고, 언행과 자태에서 고고함과 우아함이 뚝뚝 떨어지며, 학문적으로도 프루스트의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말 그대로 천상 '학자'이며 ‘교수’ 그 자체인 분이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2111642731
김희영 번역가 10년간 프루스트에만 빠져살다보니, 아직도 번역 안 끝난 기분이에요
김희영 번역가 10년간 프루스트에만 빠져살다보니, 아직도 번역 안 끝난 기분이에요, 김희영 번역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3권 완간
www.hankyung.com
학부를 거쳐간 수천 명의 제자 중 하나인 나를 기억하실 리는 없겠지만, 언젠가 강의실 밖에서 수업 외적으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석에서 본 교수님은 오히려 수더분함, 수선스러움으로 제자들을 편히 대하는 모습이었고,
이런 '일반인 같은' 면모 때문에 교수님이 더 학자, 교수로 빛나게 보였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 내가 교수에 대한 프레임 혹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편견은 ‘교수’라는 파롤(Parole)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닐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ljsUBJCJWIc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1857~1913)
1. 파롤(Parole)에 의한 프레임(Frame)
스위스의 언어학자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 1857~1913)'가 제시한 '랑그(Langue)'와 '파롤(Parole)'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쉬르는 개인이 발화를 통해 의미를 생성하고, 이 발화 행위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추상적인 구조를 '랑그'라고 불렀습니다.
랑그는 언어의 추상적인 체계로서,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사회적인 약속입니다. 이것은 체계라는 특성 상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개인의 발화를 소쉬르는 '파롤'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로써 파롤은 개인의 발화 행위로서, 체계의 구체적인 실현입니다.
파롤은 개인의 발화이므로 무한합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랑그는 개념을, 파롤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된 교수님의 이름이 '김영미'라고 가정하면, '김영미'라는 랑그를 제가 '교수님'이라는 파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자녀는 '김영미'라는 랑그를 '엄마'라는 파롤로 표현할 것입니다.
교수라는 직업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며, 일반인과는 차별화된 존재이며, 클래식 음악을 즐기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상 옷을 깔끔하게 입고, 양적인 쾌락보다는 질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분이라는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라는 이미지는 집에서 원하는 걸 들어 주고, 용돈을 주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을 것입니다.

스위스의 언어학자 페르디낭 드 소쉬르의 논점을 다시 가져와 '김영미' 교수님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김영미 교수님이 좋아하는 음악은 클래식이나 오페라 같은 고요하고 고전적인 음악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분을 '교수'라는 '파롤'로 해석하고, 그 분을 이해하기 위한 나만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미 교수님에게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 아이는 저와 같은 관점으로 아버지를 바라볼까요?
만약 김영미 교수님이 집에서 편안한 옷차림으로 티비를 보는 모습이 일상이라면,
교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학자로서의 모습보다는 가정에서의 모습을 기반으로 아버지에 대한 '프레임'을 형성할 것입니다.
김영미 교수님을 다르게 바라보는 저와 교수님의 자녀 사이의 차이점 중 하나는 교수님의 자녀가 저와 다른 '파롤'로 동일한 '랑그'를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2. 같은 뜻 , 그러나 다른 표현
1,2,3,4,5,6,7,8,9는 아라비아 숫자라고 알려진, 세계 어디에서나 알아볼 수 있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외국을 여행해도, 글자는 모르더라도 숫자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라비아 숫자들은 주로 수학 수업에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만 살아 외국어를 전혀 모르는 학생이 미국에서 "1+1=?"이라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 언어와 관계 없이 "2"라는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1=2"라는 문제를 해결한 이유는 아라비아 숫자와 사칙연산 기호가 '랑그'처럼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회적 약속을 아는 전세계 모든 사람이 "2"라는 '랑그'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2=?"라는 문제를 상대에게 제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상대는 "2"라는 '랑그'를 만들어 내기 위한 수식을 세워야 합니다. 그는 "2=1+1"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2=3-1"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사칙연산만으로도 우리는 "2"라는 '랑그'를 무한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2"라는 랑그를 표현하는 "1+1"이나 "3-1"이 '파롤'입니다. 이로써 앞서 이야기한 랑그의 한정성과 파롤의 무한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도 수학과 같이 무한한 파롤로 한정된 랑그를 표현합니다. 저는 '김영미'라는 사람을 '김영미 교수님'이라는 파롤로, 교수님의 자녀는 '엄마'라는 파롤로, 김영미 교수님의 부군은 '여보'라는 파롤로,
그리고 김영미 교수님의 부모는 '아들'이라는 파롤로 '김영미'라는 동일한 랑그를 표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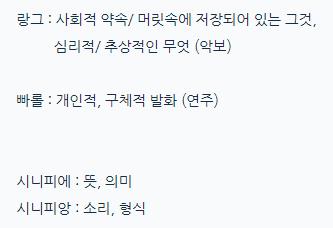
3. 근본적 귀속오류
'사이코'라는 표현은 한국에서 비논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부적절한 행동을 지칭하는 '파롤'로 쓰입니다.
그러나 일본어에서의 "さいこう("사이코"와 비슷한 발음)"는 '최상'을 의미하는 '랑그'의 파롤로 쓰입니다.
만일 한국의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사이코"라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비판적인 의미로 사용되겠지만, 일본의 친구가 동일한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칭찬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인 두 명과 일본인 한 명이 만났을 때, 일본인이 칭찬의 뜻으로 "사이코!"라고 표현한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일본어를 알지 못하는 한국인들에게는 그것이 분쟁의 기폭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인 두 명과 한국인 한 명이 만나, 한국인이 그들에게 "사이코"라는 비난의 말을 한다면, 한국어를 알지 못하는 일본인들에게는 그것이 칭찬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같은 '파롤'을 사용하더라도 서로 다른 '랑그'를 의미하여, 상호간에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를 '근본적 귀속 오류(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라고 부릅니다.
세계화가 진행되는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근본적 귀속 오류는 자주 발생합니다.
다양한 인종과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문화적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점점 더 글로벌한 관계망 속에서 살아가며, '김영미'라는 '랑그'를 '교수'라는 '파롤'로 표현함으로써 제가 김영미 교수님에게 가진 프레임을 반영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이나 누군가를 표현하는 '파롤'을 통해 그들을 왜곡(또는 프레이밍)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요?
'파롤' 때문에 우리가 '랑그'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방해받는 것은 아닐까요?